
도파민 디톡스
누리소통망(SNS)의 쇼트폼(1분 이내 짧은 콘텐츠) 영상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놀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모습에 경각심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파민 디톡스’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매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발표하는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24년 트렌드 중 하나로 ‘도파밍(도파민+파밍)’을 꼽았다.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뜻한다. 도파민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즐거움, 보상감을 주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많아도 문제다. 박종석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는 “도파민이 과잉 분비될 경우 보상회로의 과도한 자극과 도파민 수용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뇌가 항상 도파민을 강렬히 갈망하는, 도파민에 굶주린 상태가 된다”며 “항상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돼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감이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는 쉴 새 없이 시청각을 자극하는 콘텐츠에 노출돼 있다. 2023년 11월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조사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0월 한국인들의 유튜브 이용시간은 총 1044억 분으로 나타났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 취향에 맞는 짧은 영상을 속속 골라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도파민을 넘치게 끌어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파민 디톡스’ 혹은 ‘도파민 단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다. 몇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습관이 대표적이다. 이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폰을 반납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서울 강남구의 한 북카페, 정해진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가두는 ‘휴대폰 감옥’까지 생겼다.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를 인증하는 커뮤니티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파민 과잉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박 교수는 “도파민은 특히 시각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극적인 SNS 영상에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집중력, 판단력 같은 인지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하루에 일정시간은 반드시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뇌를 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 할애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시간 중 일부는 사람과 대면하거나 햇빛을 보며 야외활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도파민 과잉 분비의 원인이 꼭 스마트폰이 아닐 수 있다. 카페인, 자극적인 맛의 음식 등 자신이 ‘즉각적인 만족도’를 얻기 위해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근하 기자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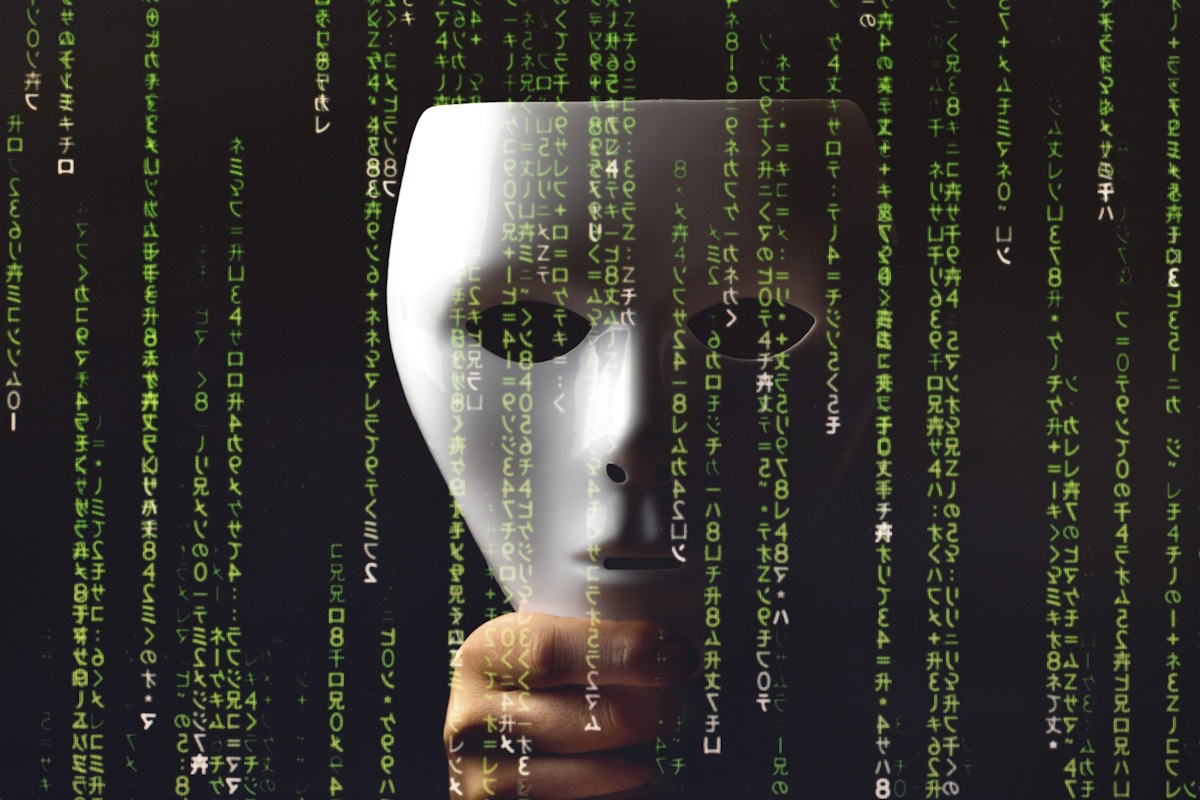
 SKOREA.NEWS
SKOREA.NEWS